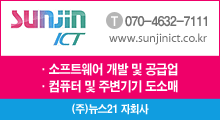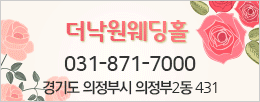그 이름과 장쾌한 의거의 내용을 아는 이는 많다. 하지만 25세의 짧은 생을 조국광복의 제단에 바친 그의 인간적 풍모를 아는 이는 그리 흔치 않다. 1920∼30년대의 시대상황 속에서 시골 벽지의 한 청년이 대한의 열혈의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더듬어 보는 것은 올해 의거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 생활의 지표를 점검한다는 뜻에서도 의의있는 일이다.
윤봉길의사(본명은 우의, 별명이 봉길, 호는 매헌)는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태어났다. 덕산보통학교와 오치서숙에서 수학하고 19세 때인 1926년부터 고향에 야학을 세워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했으며 20세 때에는 독서회를 조직하고 농민독본을 편찬했으며, 22세 때에는 월진회·수암체육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민족운동을 더욱 정열적으로 전개하였다. 윤봉길의사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23세 때인 1930년 3월6일 「장부출가 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글을 써놓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청도를 거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도착하였다. 일본군이 1932년 1월 28일 상해를 침공하여 점령한 후 4월 29일 천장절겸 상해점령 전승경축기념식을 홍구공원에서 거행하게 되어 상해점령 일본군 군·정 수뇌들이 여기에 모이게되자, 윤의사는 백범 김구선생이 지휘하는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이에 특공작전을 감행할 것을 자원하였다. 윤의사는 단신으로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상해 점령 일본군총사령관 시라가와 등 군·정 수뇌부들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처단하였다. 윤의사는 현장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5월 25일 현지의 단심 군법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1월에 일본으로 이송되어 그 해 12월 19일 25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말할 만큼 선각적인 의사였으며 우리에게 띄우는 당부일런지도 모른다.
- TAG
-
 중구문화의전당,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노자와 베토벤> 기획공연 개최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이 오는 9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5년 처음 진행된 은 지휘자 오충근과 철학자 최진석의 철학적 대담과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
중구문화의전당,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노자와 베토벤> 기획공연 개최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이 오는 9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5년 처음 진행된 은 지휘자 오충근과 철학자 최진석의 철학적 대담과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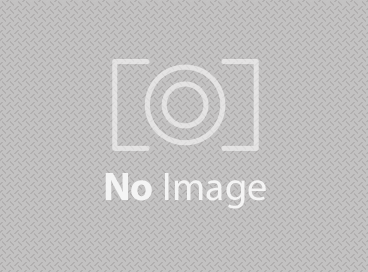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순천만
순천만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