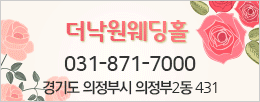- 쪼개기 계약 관행 안 없어져…14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대차 전주공장 촉탁계약직 노동자 이모씨(31)는 2013년 3월 현대차 홈페이지에 올라온 촉탁계약직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 안전교육을 받고 그해 7월2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25인승 카운티에 방음재를 넣고, 바닥 장판을 까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 신규 채용에 응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빠진 자리에서 2년간 같은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상 근무 종료일은 지난달 18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0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을 했다. 2년간 10여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경과한 뒤에 사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것이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보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관리자는 이날 “일을 중단하고 나와 있으라”고 했고, 잠시 뒤 건조물 침입 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이씨 대리인인 노무법인 참터 이병훈 노무사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여차례 반복해 근무하던 중 기간제법상의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2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현대차의 ‘쪼개기 계약’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촉탁직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울산공장 20대 촉탁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경향신문 8월5일자 1·12면 보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씨뿐 아니라 최모씨(53) 등 촉탁계약직 13명도 다음달 전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최씨 등은 2013년 8월2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트럭부에서 근무한 전주공장 촉탁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9~17차례 쪼개기 계약을 해온 회사가 지난 19일 ‘24일부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일방적 통보해왔고 정규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전주공장 촉탁직 노동자들이 일한 자리는 당초 전주공장이 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했던 곳이다. 2013년 8월 당시 정준용 전주공장장이 서명한 문서를 보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2013년 11월 정규직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최씨는 하지만 "이 문서는 백지화 됐고 정규직 대신 촉탁직 노동자들이 계속 상시 업무를 해온셈"이라고 말했다.
 고성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새글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5,895건, 4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
고성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새글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5,895건, 4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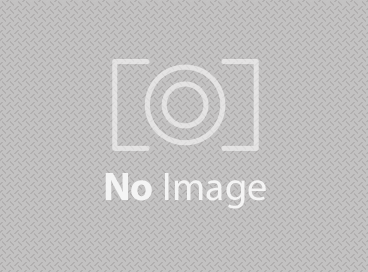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