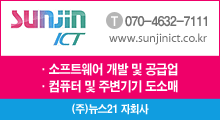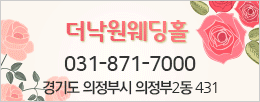- 애써 얻어낸 관세화유예 물거품…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여야 정치권이 오는 23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한 가운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준 반대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은 관세화 조건의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미루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지난해 전체 쌀 소비량의 4%(20만5000t)에서 2014년 7.96%(40만8700t)까지 매년 늘려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유예기간 중 언제라도 추가 부담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를 좀 더 지켜본 후 협상안을 비준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DDA 협상 세부 원칙이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기다렸다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유ㆍ불리를 판단하자는 것.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국회 비준을 늦출 경우 애써 얻어낸 관세화 유예가 물거품이 되고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치명타를 맞게 되므로 한시 바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WTO 회원국들은 당초 농업 분야 관세 감축안 등 세부원칙을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키로 했으나 주요 국가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내년 상반기 중 각료 회의를 다시 개최해 농업 분야 세부원칙에 합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뉴질랜드 출신 크로포드 팔코너 DDA 농업 분야 의장은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설사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합의된다고 가정해도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유ㆍ불리를 판단하기가 쉽지않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쌀 개방을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관세화 개방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군다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개도국에 대한 예외 인정 폭이 얼마나 될 지는 빨라야 내년 말에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는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의무수입 물량 반입 등 합의사항 이행을 개시해야 한다. 최근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등 협상 상대국들은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마저 커져가고 있다. 분쟁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10년간 관세화 유예가 물거품되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나라 쌀값은 국제 시세의 4~5배 수준이나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관세 상한은 100~20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더라도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년의 기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10년 유예기간을 포함해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이끌어 낸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만에 하나 DDA 협상 결과가 관세화 개방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과거 쌀 협상에서 언제든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고 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는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어렵게 얻어낸 추가적 10년간 관세화 유예기간은 개방에 대비해 우리 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약속한 쌀 협상 관련 이행 시한이 임박했으므로 국회 비준을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TAG
-
 장동혁, 차기 대선 적합도 1위…김민석·조국 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8.3%로 1위를 기록하며 선두에 올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4.3%로 2위, 장 대표와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보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12.4%로 3위를 차지했다.그 외 순위는 정청래(8.9%), 한동훈(8.2%), 오세훈(6.3%), 김문수(5.5%), 이준석(4.9%) 순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장동혁, 차기 대선 적합도 1위…김민석·조국 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8.3%로 1위를 기록하며 선두에 올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4.3%로 2위, 장 대표와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보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12.4%로 3위를 차지했다.그 외 순위는 정청래(8.9%), 한동훈(8.2%), 오세훈(6.3%), 김문수(5.5%), 이준석(4.9%) 순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추석맞이 남목2동 자생단체 합동 환경정비
추석맞이 남목2동 자생단체 합동 환경정비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삼척항 어시장
삼척항 어시장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1억 6,000만 원 전달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1억 6,000만 원 전달
 울산교육청, 동구에 소통 배움 나눔터 개관
울산교육청, 동구에 소통 배움 나눔터 개관
 울산교육청, 신임 감사관에 정웅정 씨 임명
울산교육청, 신임 감사관에 정웅정 씨 임명
 블랙이글스에어쇼
블랙이글스에어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