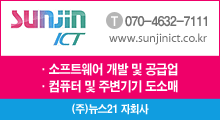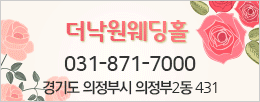90년 이후 출간된 현대소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무얼까. 물론 우리말의 문장 종결 지정사(指定詞)‘∼이다’가 가장 많이 사용됐지만, 그외에 가장 빈번하게 쓰인 어휘는 대명사인 ‘나(我)’였다. 또 의존명사인 ‘것’(3위)과 ‘수’(13위)가 의외로 자주 사용됐으며, 구어체와 외래어의 비중이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국립국어연구원 김한샘(학예연구사) 박사팀은 90년 이후 현대소설 중 이문열의 ‘시인과 도둑’, 김정현의 ‘아버지’, 임철우의 ‘봄날’ 등 203편을 선정, 2년 동안 일일이 어휘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여 ‘한국현대소설의 어휘조사연구’를 최근 펴냈다.
그동안 ‘염상섭의 어휘연구’등 작가 개인의 소설을 대상으로 한 작업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분석하기는 처음이다. 현대소설의 어휘빈도가 사회를 다각도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와 국문학은 물론 사회학 연구 등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가 자주 사용된 것은 근래 많은 소설이 ‘1인칭 주관적 시점’인 ‘나’를 통해 서술된다는 걸 보여준다. ‘나’의 빈도가 높은 것은 90년을 전후해 사회문제에서 개인으로 침잠해가는 사변적인 소설이 주류를 이룬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자주 사용된 대명사는 3인칭 ‘그’(6위), ‘그녀’(18위), 뒤를 이어 ‘우리’(31위)의 순이었고, 2인칭인 ‘너’(57위), ‘당신’(75위), ‘자기’(116위) 등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됐다.
일반어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명사(총 2만6250개)에선, ‘말 많은 세상’을 상징하듯 ‘말’(言·16위)이 가장 많이 쓰였다. ‘말하다’(32위)라는 동사도 덩달아 순위가 높았다. 이어 역시 ‘사람’(17위)이 많았고, 시간을 나타내는‘때’(22위), ‘일’(24위) 등의 순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33위)가 ‘어머니’(52위), ‘아버지’(63위), ‘남자’(69위)보다 자주 사용 된 점.
명사 중 ‘∼색(色)’과 관련해서는 ‘회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채롭다. 현대문명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하는 회색의 뒤를 이어 검은색-갈색이었고, 다음이 흰색-녹색-빨간색 순이었다.
의존명사인 ‘것’과 ‘수’의 빈도가 상위권인 것은 현대 문장의 복잡성과 영어식 문장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김 박사는 “특히 구어체가 일반 소설문장에 그대로 사용되는 사례가 아주 많았으며, 이로 인해 표준어에 어긋나는 표기가 적지 않았고 또 잘못 쓰인 외래어 표기가 빈번한 것도 현대소설의 특징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연결어미 ‘∼하고’는 ‘∼하구’로, 종결어미 ‘∼라고’는 ‘∼라구’로, 보조사 ‘∼도’는 ‘∼두’로 가장 자주 오류를 범했는데, 이같은 구어체 어투가 온라인 채팅에서 일반화되면서 소설문장에도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박사는 “소설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란 점에서 이같은 어휘의 변화는 다시 국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소설가들이 아름답고 바른 우리 어휘를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TAG
-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그러면...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그러면...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당)...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당)...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서산 간월암
서산 간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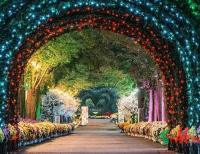 연천 피날랜드 국화 축제
연천 피날랜드 국화 축제
 서산 해미읍 축제
서산 해미읍 축제
 논산 탐정호 돈암서원
논산 탐정호 돈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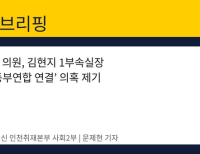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