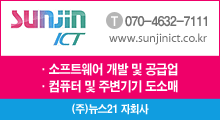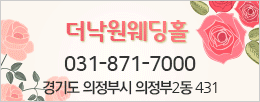총선, 대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선거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나는 트로트를 개사한 선거로고송이 전국에 울려 퍼진다. ‘선거로고송’하면 바로 떠오르는 트로트 가수들이 있을 정도로 트로트의 인기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도 트로트를 선호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린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자극적이고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트로트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고송으로 트로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트로트의 메시지 전달력 때문일 것이다. 빠른 템포의 귀에 익은 멜로디와 트로트 특유의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가사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름을 알리기 좋은 구조이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빠 한번 믿어봐” 같은 가사에 후보자 이름만 넣어서 불러도 될 정도이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선거로고송의 최종 소비자는 유권자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선거로고송의 선택기준이 되는 것이 사살이지만, 결국 듣는 사람은 유권자다.
만일, 유권자가 자신의 공약과 이름이 담겨있는 노래를 듣고 인상을 찌푸린다면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름을 각인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공일 수 있겠으나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의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 만은 아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텍스트 형태로 기억하기 때문인데, 후보자 이름을 기억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해 얻은 이미지도 텍스트화 하여 저장할 것이다.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당연히 후보자 이름 옆에 좋지 않은 단어가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선거로고송 선택에 있어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유권자와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자
위와 같은 고민을 하며 선거로고송을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느낌의 선거로고송 메이킹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에스터뮤직(ASTER MUSIC)의 선거로고송 제작팀이 그들이다. 젊은 유권자들을 생각하며 만든 ‘99%의 랄랄라’, ‘그날이 왔다’ 등의 선거로고송은 “참신하다”, “앨범 내도되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에스터뮤직은 “선거로고송으로 트로트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닌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음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선거로고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워크스페이스
- TAG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인연...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인연...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청도 운문사
청도 운문사
 송이버섯
송이버섯
 삼척항 어시장
삼척항 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