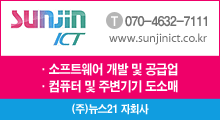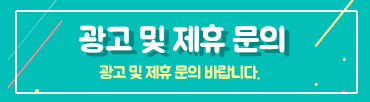▲ [이미지 = 픽사베이]
▲ [이미지 = 픽사베이]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의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체줄한 보고서에서 전시 강제도원 여부를 부정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지난 3일 외교부는 전날(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제출된 일본의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은 이후 두 번째로 낸 이번 보고서에서도 문제의 표현과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만들겠다고 했고, 목적을 '싱크탱크'라고 명시했다. 이 정보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지난달 이미 완공됐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외교당국 간 협의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명 1+1(한일 기업 자발적 배상)+α(양국 국민 자발적 성금)’ 안이 유력한 해법으로 부상한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당사국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하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비상 의료체계 가동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비상 의료체계 가동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 [이미지 = 픽사베이]
▲ [이미지 = 픽사베이]


 함흥시, 다자녀세대 우대법 명목으로 고아 입양 논의
함흥시, 다자녀세대 우대법 명목으로 고아 입양 논의
 평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남성 공개 비판 진행
평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남성 공개 비판 진행
 우크라이나, 올림픽 추모 헬멧 금지 IOC 결정 강력 비판
우크라이나, 올림픽 추모 헬멧 금지 IOC 결정 강력 비판
 미국, 나이지리아 군 훈련 위해 미군 200명 파견
미국, 나이지리아 군 훈련 위해 미군 200명 파견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