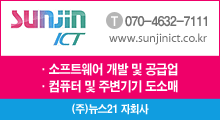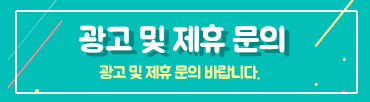▲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최고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 80%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역대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드러났고, 그 정도가 심각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피해 6건에 대해 40~80%의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그동안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우리은행을 들었다.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79세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했다. 은행은 DLF를 팔기 위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써 넣었다. 이 노인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20% 넘게 손해봤다.
DLF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7950억 원 어치가 팔렸고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이상의 투자금을 잃었다.
그 결과 총 276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원금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결정한 6건 외 204건에 대해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 조정으로 배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손실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 조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비상 의료체계 가동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비상 의료체계 가동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함흥시, 다자녀세대 우대법 명목으로 고아 입양 논의
함흥시, 다자녀세대 우대법 명목으로 고아 입양 논의
 평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남성 공개 비판 진행
평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남성 공개 비판 진행
 우크라이나, 올림픽 추모 헬멧 금지 IOC 결정 강력 비판
우크라이나, 올림픽 추모 헬멧 금지 IOC 결정 강력 비판
 미국, 나이지리아 군 훈련 위해 미군 200명 파견
미국, 나이지리아 군 훈련 위해 미군 200명 파견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