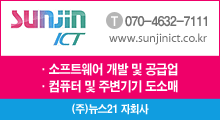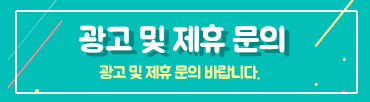▲ [사진제공 = 문화재청]
▲ [사진제공 = 문화재청]
경복궁 동궁(세자궁) 남쪽에서 현대식 정화조 방식으로 하루 150여명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화장실 유구가 발굴됐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8일 오전 경복궁 흥복전에서 경복궁 동궁 남쪽 지역에서 발굴된 화장실 시설을 공개했다.
오동선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유입된 물은 화장실에 있는 분변과 섞이면서 발효를 빠르게 하고 부피를 줄여 바닥에 가라앉히는 기능을 했다"며 "분변에 섞여 있는 오수는 변에서 분리되어 정화수와 함께 출수구를 통해 궁궐 밖으로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발효된 분뇨는 악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독소가 빠져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 연구사는 "부패조, 침전조, 여과조로 구성된 현대식 정화조 구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석조 구덩이는 길이 10.4m, 너비 1.4m, 깊이 1.8m에 달하며 바닥부터 벽면까지 모두 돌로 만들어져 분뇨가 구덩이 밖으로 스며 나가는 것을 막았다.
궁궐 내부에서 화장실 유구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경복궁 화장실 유구의 발굴은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조선 시대 궁궐의 생활사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규모는 4∼5칸인데, 한 번에 최대 10명이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 전문가로 이날 공개회에 참석한 한국생활악취연구소장인 이장훈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굴된 화장실 유구에 대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 150명이 배설해도 충분한 크기를 갖추고 있는 대형 화장실"이라고 소개했다.
1인당 1일 분뇨량 대비 정화시설의 전체 용적량(16.22㎥)으로 보면 하루 150여 명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물의 유입과 배수 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많다.
전문가들은 150여 년 전 정화시설을 갖춘 경복궁의 대형 화장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고대 유적에서 정화시설은 우리나라 백제 때 왕궁 시설인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분변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물을 흘려보내 오염물을 정화시킨 다음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는 이전보다 월등히 발달된 기술이다.
이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화장실 유구에 대해 "현재 발굴된 유구는 물을 화장실 내부 하부로 유입시키는 형태"라며 "이는 분뇨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발효다. 그 과정에서 미생물 영양 물질이 물이다. 가수분해가 일어나 미생물들이 유입된 물 먹고 일생을 다해 죽게 되는 형태다. 그 과정을 거쳐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굴된 이런 유구 형태는 유입구 자체가 유출구보다 낮다"며 "이는 분뇨들이 내부에서 처음에는 가라않는다. 물 속에서 정화되면 유기물은 자기 할 일해 죽고 물 위로 뜬다, 현대식 정화조도 유입구 물의 3분의 1로 되어 있다. 나가는 물 깊이는 2분의 1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화 방식이 지금 발굴된 유구 형태와 유사하다"며 "물을 이용해서 정화 과정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 외국에도 거의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 [사진제공 = 문화재청]
▲ [사진제공 = 문화재청]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건군절 맞아 인민군대 원호사업 활발
북한, 건군절 맞아 인민군대 원호사업 활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원전 전력 절반 감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원전 전력 절반 감소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