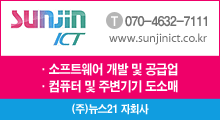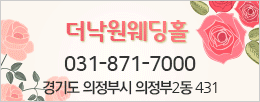이번 정월대보름엔 인현황후의 기력을 회복시켰다는 향온주(香?酒), 솔향기 가득해 선비들이 즐겨 마시던 송절주(松節酒), 임금부터 민간까지 널리 사랑받은 삼해주(三亥酒) 등 서울 전통주로 귀밝이술을 즐겨보자.
서울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형문화재로 전해지고 있는 서울의 전통주를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 직접 시연.시음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현왕후의 기력을 회복시켜준 향온주 (香?酒)
대보름 하루 전날인 16일(수)엔 향온주 기능보유자인 박현숙 선생의 시연이 펼쳐진다.
1993년 2월 13일 서울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향온주는 임금이 마시고 신하에게 하사한 어사주이다.
조선이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오백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대궐 안에는 솜씨 좋은 상궁들과 숙수들이 있었고 물자 또한 풍부하여 궁중 음식을 비롯하여 수십 가지 술이 발달했다.
특히 대궐에서는 술 빚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대궐 내 내의원(內醫院) 소속의 양주처라는 관청을 따로 두어 어의(御醫) 처방을 받아서 모든 재료를 어의들의 철저한 감시 아래 술을 빚었고 술 항아리를 왕금색 보자기로 덮는 등 그 관리가 철저했다.
이렇듯 귀한 궁중술이 민가에 전해진 데에는 인현왕후의 이야기가 있다.
숙종 임금의 왕비인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에게 모함을 받아 궁에서 쫓겨나와 사가에 유폐되었는데 이로 인해 오랜 세월을 병석에 눕게 되었다. 나중에 복권하여 환궁하려 하였으나 기운을 차리지 못해 대궐에서는 상궁이 향온주를 가지고 나와서 서너 수저 떠 먹여 드렸더니 곧 기운을 차리고 환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후일 인현왕후 외가 중 조모 집안인 하동 정씨 가문에 전래되어 가양주로 명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주세법령이 시행되면서 완전히 잊혀진 듯 했으나, 서울시에서 정도 600년 사업(1993년)으로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기능보유자인 박현숙씨에 의해 전승, 전수생 교육과 시연을 하고 있다.
솔향기 가득해 선비들이 즐겨 마신 서울 송절주(松節酒)
정월대보름 다음 날인 18일(금)엔 송절주 기능보유자인 이성자 선생의 시연 및 시음행사가 진행된다.
서울무형문화재 제2호인 송절주는 1989년 9월 30일 지정되었으며 송절(松節, 싱싱한 소나무 가지의 마디), 진득찰, 당귀, 진달래꽃(봄, 가을에는 국화), 솔잎 등을 넣어 빚은 술을 말한다.
송절주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고증은 없으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규합총서(閨閤叢書)'등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중엽인 16세기부터 시작, 서울부근 중류계층에서 빚어 마시던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란 당시의 장군인 충경공 이정란(李廷鸞 본관 전의)장군의 14대손인 필승의 처 허성산(許城山, 1892~1967)이 남다른 소질과 취미가 있어 술을 양조하였으며 수대에 걸쳐 전승된 것을 그의 자부 박아지(朴阿只)에게 전승하여 현재는 이성자씨가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
송절주는 독특한 소나무 향기와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뜻으로 인하여 선비들이 각별히 즐기던 술이었다고 한다.
임금부터 민간까지 널리 사랑받은 삼해주(三亥酒)
또한 매주 목요일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는 삼해(약)주 기능보유자인 권희자 선생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사전 교육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993년 2월 13일 서울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삼해주는 찹쌀을 발효시켜 두 번 빚는 약주를 말한다. 정월 첫 해일(亥日, 돼지날)에 시작해 매월 해일마다 세 번에 걸쳐 빚는다고 해서 삼해주라고 하며, 버들가지가 날릴 때쯤 먹는다고 해서 유서주(柳絮酒)라고도 한다. 현재 삼해약주, 삼해소주 두 종류가 전해져 온다.
삼해주는 고려 때부터 제조한 술로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태평한화(太平閑話)’, ‘주방문(酒方文)’, ‘역주방문(曆酒方文)’ 등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선조때 문인 노계 박인로의 가사에도 삼해주의 기록이 보인다
“… 다만 어젯밤의 거넨집이 져사람이
목불근 수기꿩을 玉指損에 쭈어ㄴ·이고
간이근 삼해주를 취토록 권ㅎ·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아니 감흘넌고 …”
삼해주가 다른 지방보다 서울에서 애음된 이유는 당시 귀했던 쌀을 3차까지 덧술해 만든 술이므로 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세종에 와서 소주를 마시는 풍조가 성행했는데, 성종 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연회에도 모두 소주를 사용했다고 한다. (성종실록21년 4월10일) 따라서 권력과 상권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삼해주가 널리 애용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에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널리 삼해주가 애음되었는데, 영조 9년 형조판서 김동필이 ‘세수에 매주가에서 삼해주를 많이 만들어내니 서울에서 들어오는 미곡은 죄다 이리로 쏠려 들어가니 미곡정책상 이를 금함이 옳다’상소한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秋官志 第四) 당시 서울에서는 일반인들의 삼해주 수요가 많아져 정월에 빚어야하는 계절적인 제한으로 그 수효가 한정되자, 서울 근교의 마포 옹막이를 삼해주의 대량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서울 마포 옹기점들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컸다 한다.
삼해주는 그 제조방법도 매우 다양한데 쌀과 누룩을 원료로 만들어 은은한 맛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능보유자 권희자, 이동복씨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교육과 시연을 하고 있다.
2월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삼해(약)주 기능보유자 권희자 선생의 교육(사전신청자 한정)과 송절주, 향온주의 시연 외에도 악기장인의 연주와 민화장인의 그림시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장에는 ‘민화와 체’를 주제로 기획전시도 꾸며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다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불출석... 불출석 이유는 현기증과 구토 증세
지난주, 두 달 반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이었는데, 촬영이 끝난 뒤 진행된 보석 심문에선 작심한 듯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보석을 인용해 주면 당뇨식과 운동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재판부와 흥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그리고 ...
윤석열 전 대통령 또다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불출석... 불출석 이유는 현기증과 구토 증세
지난주, 두 달 반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이었는데, 촬영이 끝난 뒤 진행된 보석 심문에선 작심한 듯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보석을 인용해 주면 당뇨식과 운동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재판부와 흥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그리고 ...
 동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9월 마지막 활동으로 소화전 도색 및 안전 홍보 실시
[뉴스21일간=임정훈 ]동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정혜옥)는 9월 마지막 주를 맞아 119화암센터 일대에서 소방용수 점검과 소화전 도색, 잡초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관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소화전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도색 작업을 병행했...
동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9월 마지막 활동으로 소화전 도색 및 안전 홍보 실시
[뉴스21일간=임정훈 ]동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정혜옥)는 9월 마지막 주를 맞아 119화암센터 일대에서 소방용수 점검과 소화전 도색, 잡초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관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소화전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도색 작업을 병행했...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전문상담 인력,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
전문상담 인력,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
 강북교육지원청, 추석 명절맞이 온정 나눔
강북교육지원청, 추석 명절맞이 온정 나눔
 국민의힘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 대회 2025년9월25일 일요일 14시 시울 시청앞 윤제욱 의원
국민의힘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 대회 2025년9월25일 일요일 14시 시울 시청앞 윤제욱 의원
 트럼프, 전 세계 미군 장성급 회의 참석… 콴티코 해병대 기지서 개최
트럼프, 전 세계 미군 장성급 회의 참석… 콴티코 해병대 기지서 개최
 트럼프 “美 공장 없으면 의약품 100% 관세”…국내 제약사도 긴장
트럼프 “美 공장 없으면 의약품 100% 관세”…국내 제약사도 긴장